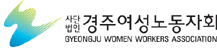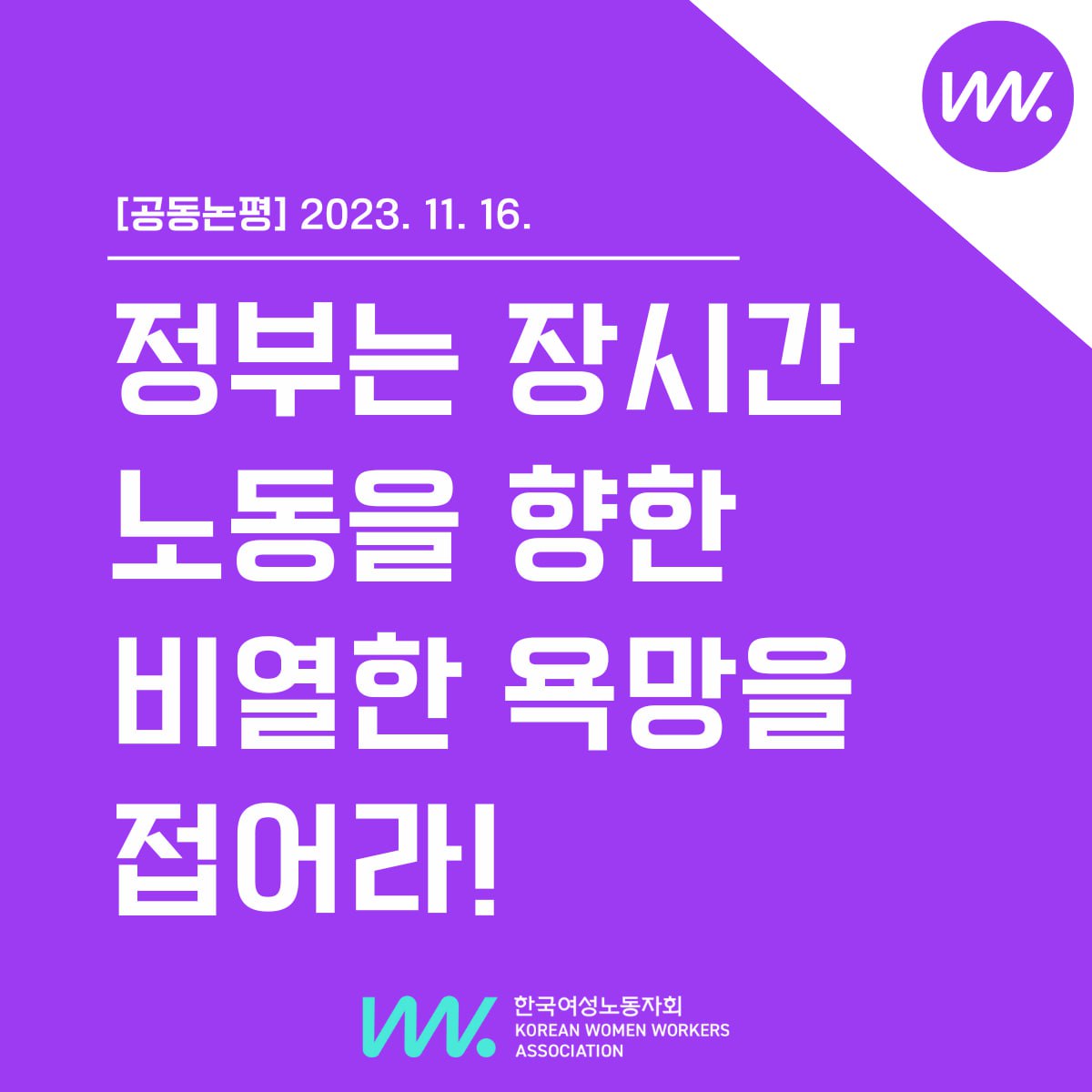
[공동논평]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향한 비열한 욕망을 접어라!
정부가 ‘주 69시간(주 6일 근무 기준)’ 논란 뒤 8개월 만에 지난 13일,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특정 업종·직종의 연장근로를 유연화한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무리수를 던진 후 거세게 역풍을 맞았다. 이후 8개월 동안 웅크린 후 설문조사에 근거한 정책이라 주장하며 다시 들고 나왔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의 방향과는 반대이다. 사업주 85.5%는 ‘최근 6개월간 현행 근로시간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예외를 두는 것이다. 예외는 배제를 낳고 필연적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한다. 시민들은 원치 않는다.
또한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가 원하는 경우’라는 과정에 대한 합리적 합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노사는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사업주와 대등한 힘의 균형을 갖기 어렵다. 하물며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서는 노사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대등한 위치에서 만들 수 없다. 사업주의 마음대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에서 1주일 48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 비율은 17.5%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OECD가 집계한 한국 노동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752시간보다 149시간이나 많다. 관련 통계가 있는 35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연 근로시간이 긴 나라는 튀르키예·멕시코·콜롬비아·코스타리카 4개국뿐이다. 장시간 노동국가 대한민국은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노동자는 삶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가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장시간 노동은 여성노동자에게 특히 더 불리하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나눌 수 없는 돌봄의 책임은 모두 여성노동자가 떠 맡게 된다. 장시간 노동을 감당하기 어려운 여성노동자들은 더 낮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유지, 존속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향한 비열한 욕망을 버려라. 지금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할 것은 노동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이다. 그것이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이다.
2023. 11. 16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